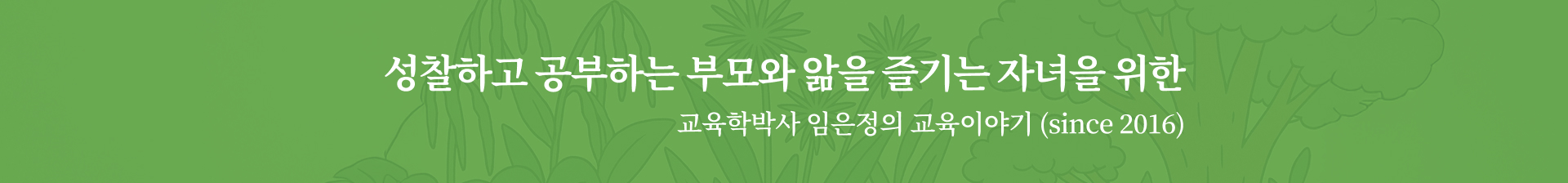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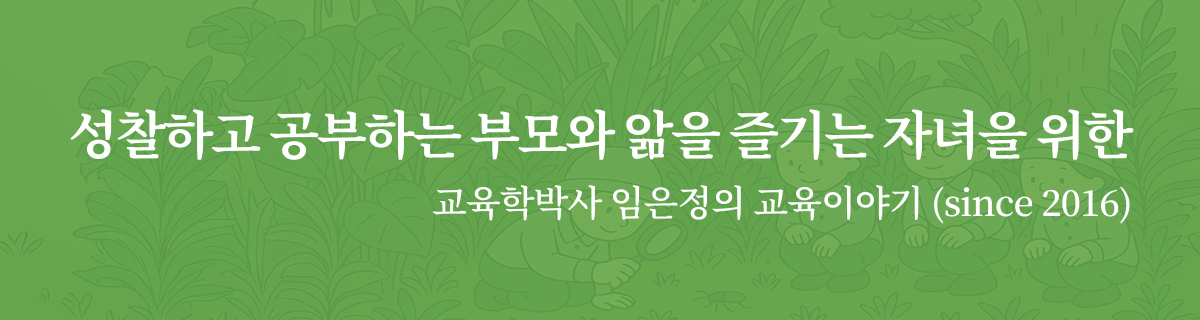
학부모님께서 지난 월요일 아침방송을 보시고 말씀 해주셔서 찾아보았다. 한 건축학과 교수님이 학교와 교도소를 건축으로 비교한 것이었다. 그렇게 비교하는 것이 새롭게 느껴졌다. 정말 학교와 교도소 구조와 배치가 비슷했다. 건축을 가르치는 교수자이기에 교육에 대한 건축의 의미를 담을 수 있었다고 본다. 구조가 같다는 것은 그 용도와 필요성이 같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12년의 수감생활”이라는 조금 껄끄러운 표현으로 바깥과 단절된 환경을 꼬집었다. 페쇄적인 환경이 구성원에게 주는 영향도 언급했다. “19세기 학교에서 20세기 교사가 21세기 학생을 가르치고 있다”는 엘빈토플러의 이야기도 했다. 모두 공감되는 이야기들이었다.
그러나 나와 생각이 다른 하나가 있었다. 아니 어쩌면 표현만 다른 것인지도 모르겠다. 20세기 교사는 적게 가르치고 나머지는 학생에게 맡기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21세기를 20세기 교사가 예측하여 지식을 전수하는 것은 어렵지만 교사의 역할과 교수 방법이 달라져야 하고, 교사가 할 일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학생 스스로 지식을 찾아내도록 길을 함께 만들어 주려는 노력과 관찰을 기초로 소통하는 교사가 필요하다. 그 건축과 교수님도 교실구조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가진 것으로 보아서 일방적인 교수법이 바뀌어야 한다는 표현을 간단하게 한 것 같다.
우리나라 학교가 처음 생긴 그대로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시대와 이론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다. 집단의 의식이 바뀌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지만 학부모의 의식변화로 교육 변화를 이끄는 편이 빠르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이다. 전직 교사를 중심으로 대안적 교육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초기에는 공교육에 대한 부적응의 대안으로 시작되었으나 이제는 공교육 체제의 기준으로 우수한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다양성이 인정되는 세상에 다양한 교육 현상이 극히 정상적이다. 빠른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거대한 조직을 신뢰하기보다는 ‘교육은 실험’이라는 듀이의 말을 실천하는 세상이다. 교육은 늘 실험일 수밖에 없다. 교육은 사회문화에 늘 함께 움직이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어제의 옳은 교육이 오늘도 옳은 교육이라고 할 수 없기에 늘 새롭고 늘 실험적일 수밖에 없다. 누구도 모든 집단 구성원에게 완벽한 교육을 만들 수는 없으므로 교육실험의 중심에 무엇을 놓는지가 중요하다. 학교건물이 학생의 권익을 우선하지 않고 통제의 수월성에 우선 가치를 두었다는 것은 문제이다. 모든 교육실천에 학생의 행복, 미래와 권익이 판단 준거가 되어야 한다. 학생 개개인의 입장에서 가치로운 교육이 되기를 소망해본다.
교육학박사 임은정의 2018. 12. 16. 교육이야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