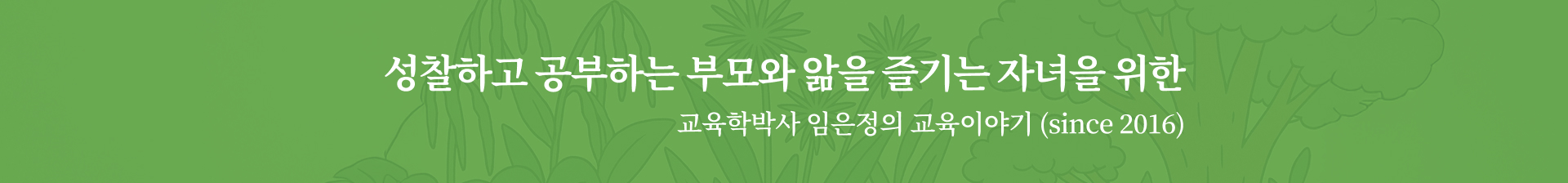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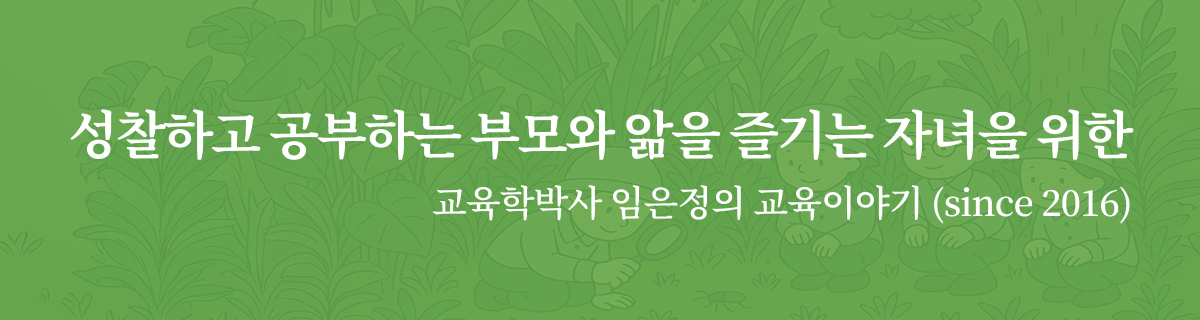
음악, 미술 등의 예술 활동 교육목표를 쓸 때 국가수준 교육과정부터 단위활동에 이르기까지 늘 쓰는 상투적인 언어표현이 ‘심미감을 느낀다’이다. 그렇게 써 놓고 새노래 따라 부르기 등의 교사 주도적인 활동 방법을 택한다. 그럴 때 과연 심미감을 얼마나 느낄 수 있을까?
여름반의 대화
00: 선생님, 이거 새로운 노래에요?
교사: 네. 이번 주도 새로운 클래식을 가져왔어요.
00: 이건 사자가 나타날 때 나는 소리 같아요.
교사: 정말 사자가 나타나는 것처럼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겠어요.
00: 그리고 이건 피아노랑 기타랑 플롯으로 만든 노래 같아요.
교사: 음악을 자세히 듣고 떠오르는 계절을 이야기 해보세요.
**: 여름이요. 여름에 비가 많이 오는 소리 같아요.
우리 유치원은 놀이시간이나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매주 새로운 클래식 음악을 듣는다. 비발디의 사계에서 여름을 들으며 여름 반 유아들이 나눈 대화를 보면서 이것이 진정한 창의성과 심미감이라는 것이 느껴진다. 유아들의 생각이나 유추한 내용이 틀리면 어떻겠는가? 유아들은 나름대로 곡을 느끼고 해석하면서 예술적 창의성을 키워 간다.
점심시간, 교사가 유아들에게 이번 주 노래 해바라기를 틀어준다.
00: 와~ 선생님, 이 노래 뭐야?
교사: 이번 주 노래 해바라기에요.
00: 해바라기?
00이가 화면을 보며 노래를 듣다 밥을 먹기 시작한다.
00: 와, 참 예쁜 노래다~
다른 봄 반
**: 이 노래 모두 반복되는 말 같은데요?
위의 기록은 봄 반의 기록이다. 클래식이 아닌 동요도 느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 부르고 암기하는 것 보다 심미감을 갖는 예술수업이 되길 바란다. 유아들의 정서 발달에 괜찮은 음악이라면 어떤 장르도 좋다. 클래식도 동요도 유아들이 나름대로의 해석을 할 수 있는 자유로운 표현의 교수학습 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한 작가가 했던 말이 생각난다. 자신의 소설을 교과서에 싣고 싶다는 제안이 들어왔는데 거절 했다는 말이었다. 이유는 전체가 아닌 일부를 발췌한다는 것과 그 내용을 가지고 정답을 요구하는 문제를 낼 것이기 때문이었다고 했다. 문학작품은 각자의 해석으로 읽는 것이지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교육학박사 임은정의 2019. 07. 12. 교육이야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