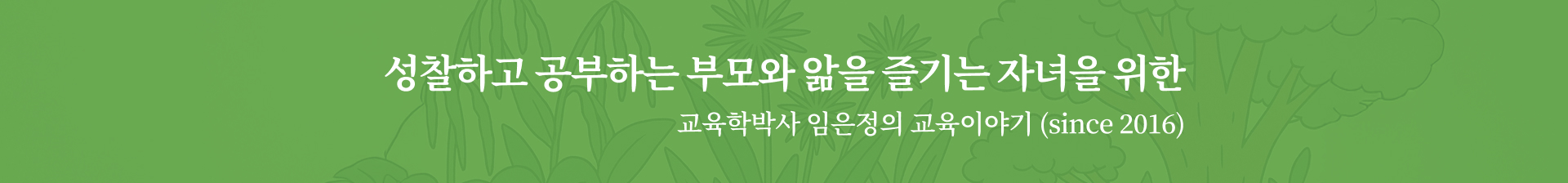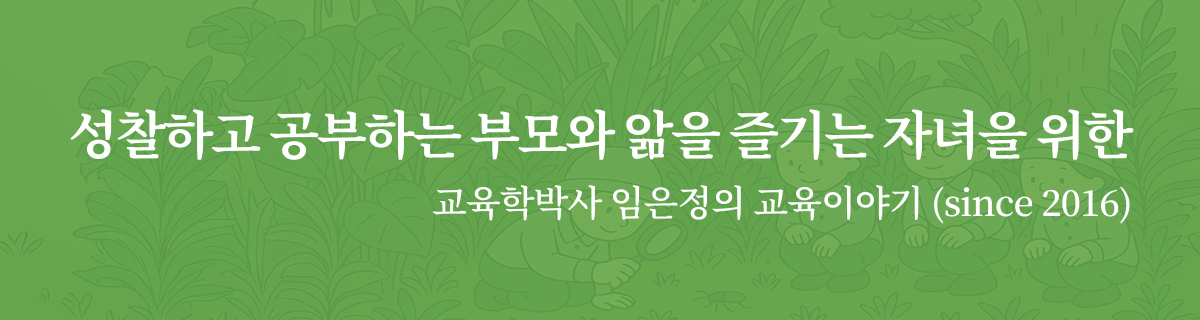내가 박사과정에 입학하던 첫 학기, 학습심리 수업을 들었다. 지금은 서울대 교육학과의 중견 교수님이신 지도교수님은 당시 미국에서 막 귀국하신 새내기 교수님이었다. “초등학생도 미적분을 배울 수 있다”고 말씀하시며, 관련 이론과 논문들을 함께 읽고 토론하게 하셨다. 주말 스터디까지 자청할 만큼 열정이 넘치셨다. 그러나 그때의 나는 그런 새로운 이론들이 낯설고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나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자라왔다. 같은 교실, 같은 시간, 같은 내용을 배우는 것이 교육이라 믿었고, 그렇게 길들여져 있었기에 많은 이론적 자료를 읽고도 고개가 갸우뚱해졌다.
“학습은 연령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탐색의 깊이에 따라 가능해진다.” 당시에는 쉽게 와 닿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르고 현장에서 유아들과 학생들을 직접 만나고 가르치며, 그리고 오랜 시간 연구와 실천을 이어오면서 나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비로소 실감하게 되었다. 학습은 저마다 다른 이해의 방식과 느긋한 탐구의 과정이 있을 때 비로소 ‘느낌’이 오고, 그때 얻은 지식은 자신의 것이 되어간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교수학습의 출발점은 지식을 암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무언가를 ‘느끼게’ 하는 데 있다. 그 느낌은 관찰하고, 비교하고, 상상하고, 연결하면서 생겨난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배움은 시작된다.
이번 주 세계지리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이 스스로 주제를 정하고 공부하며 각자 발표한다. 물론 이런 활동은 나와 6년 이상 함께 배움 훈련을 해온 학생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3세부터 시작해 9세 전후가 된 학생들이 발표를 한다. 그보다 어린 학생들은 형님들의 수업을 5분 정도 듣고 질문도 해보며, 그들만의 활동을 진행한다. 이번에는 내가 “위도 30도에서 60도 사이에 위치한 나라들을 찾아보자”는 활동을 제안했다. 지구본을 들여다보고, 지도를 펼쳐보며 학생들은 각자 탐색을 시작한다. 그렇게 충분한 시간을 주면 서로 도와가며 찾은 나라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야~ 여기는 나라 이름이 정말 많아.” “여기 유럽인데 왜 이렇게 많지?” “여기는 나라가 거의 없네.” 이야기를 주고받은 후, 각자의 공책에 자신이 찾은 나라들을 정리한다.
어떤 학생은 유럽에 나라가 많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고, 또 어떤 이는 남반구의 상대적 빈약함을 깨닫는다. 그 활동으로도 학생들은 위도와 지리, 분포와 특징, 지역 간 차이를 스스로 연결해낸다. 이런 수업은 당연히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건 ‘속도’가 아니라 ‘깊이와 재미’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국가수준 교육과정대로라면 이건 중학교 2학년쯤 배워야 할 내용이니까, 지금 7~8살 학생들에게는 시간이 너무 충분하기 때문이다. 만약 중학교 수업시간에 이런 방식으로 하자고 한다면, 아마 원성이 자자할 것이다. “진도 밀려서 큰일 났다.”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 나이 또래에는 이런 활동을 한다 해도 감흥도 없고 재미도 없을 수 있다. 하지만 7살 전후의 눈으로 보면 이건 완전히 새로운 지식이고, 배움의 즐거움이다. 천천히, 깊이, 스스로 알아낸 기쁨을 맛보는 시간이다. 느낌에서 시작된 배움은 오래 남는다. 자기 언어로 표현되고, 또 다른 질문을 만들어낸다. 이것이 내가 추구하는 교수학습의 시작이다.
수업 설계는 ‘경험의 흐름’을 따라간다. 시간을 충분히 준 뒤, 나라를 찾아보고 각자의 느낀 점을 말로 표현하게 한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느꼈든, 모두 다 괜찮다. 진도와 내용이 정해져 있는 교육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 자신만의 언어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만큼 지식을 만들어간다. 교사 중심이 아닌, 학습자 중심의 수업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되고, 협력이 더 즐겁고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간다. 나는 유아기부터 조금 어려워 보이는 세계지리 수업을 시도한다. 못할 것이 없다. 유아들은 이것을 ‘수업’이라 부르지 않을 뿐, ‘핵심어 활동’이라는 이름으로 동일한 배움을 이어간다.
재미있게 지도를 구분해서 색칠하고, 나라 위에 국기를 붙이고, 오리고 만들고. 그 과정에서 “재미있다”고 말하는 순간, 유아들은 배움의 즐거움을 알기 시작한 것이다. 대한민국 유아 교육과정에는 이런 ‘어려운 놀이’가 들어 있지 않다. 누리과정에 숫자는 10까지만 배우도록 되어 있다. 이유는 사교육을 반대하는 공교육의 입장과 같다. “공교육 정상화에 방해가 되니까.” 그런데 정말, 그 말에 동의하는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 현실은 공교육 교사들도 자기 자녀를 사교육에 맡긴다. 정말 설득력이 없는 억지이다. 그렇다보니 너무 쉬운 교육을 뛰어넘는 사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유혹이 부모들에게 생길 수 밖에 없고, 유아나 학생들은 또다른 주입식교육에 노출되며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
나는 공교육의 정상화에 관심이 없다. 다만 내가 맡은 유아들과 학생들에게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을 알려줘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을 뿐이다. 그렇게 했을 때, 유아들은 스스로 배움을 즐기며 성장해 간다는 것을 나는 이론뿐 아니라 수많은 경험을 통해 확인했다. 내가 추구하는 교수학습은 결코 빠르게 뛰어넘는 선행학습도, 개념을 주입하는 교육도 아니다. 각자의 발달과 지식 수준에 맞춰서, 자신의 속도와 방식으로 탐색하고, 깨닫고, 나누고, 또 질문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공교육, 사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 알게 되는 것은 즐거운 일’이라는 경험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교수학습을 해야 한다. 그것이 내가 말하고 싶은 핵심이다.
교육학박사 임은정의 2025. 04. 17. 교육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