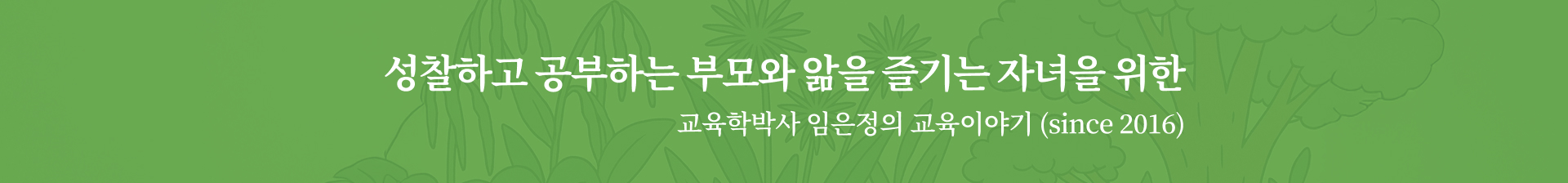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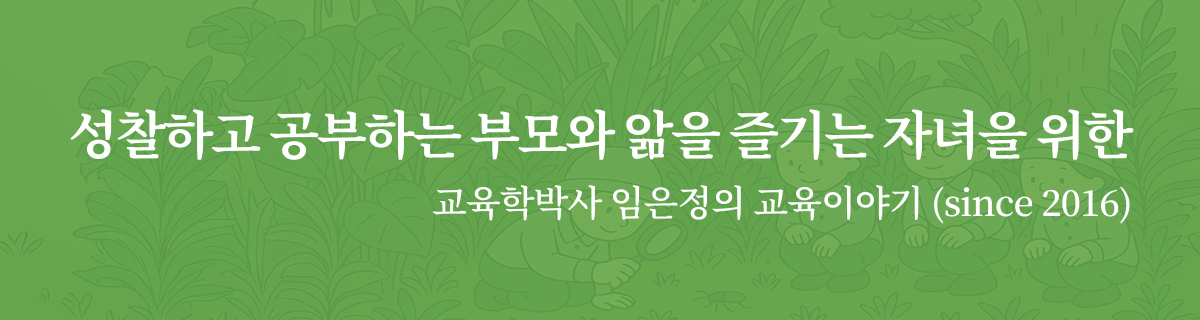
우리 유치원은 교육 혁신, 교육 선진화 등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방문을 한다. 신문기자가 12월에 취재를 왔었다. 유치원 취재차 왔다가 한숲학교(대안교육)에 관심을 보였었고, 그 내용이 종이 신문과 온라인에 게재되었다. 기자와 우리 급식을 먹으면서 충분이 대화를 했었다. 본인이 느낀 바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었기 때문에 우리 대안 교육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기사가 나오고 나서 두 가지 표현이 마음에 걸렸다.
기사의 내용은 기자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내가 바꿀 수는 없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게 너무 힘들고 재미가 없었어요. 숲에서 노는 게 가장 재밌어요.”라는 어린이 이야기를 그대로 게재한 것은 사실이니 할 말은 없지만 즐거움 속의 배움이 전달되지 않은 듯해서 마음에 걸렸다. 어린이들은 즐거워야 하고 놀아야 한다. 하지만 교육현장은 배움과 지혜에 대한 책임감과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철학이다. 무작정 놀기만 하는 곳이 행복한 곳은 아니다. 인간발달의 성취욕구도 고려되어야 한다. 유아 발달과 신체 발달에 대한 중앙대 전선혜 교수님의 인터뷰 내용이 함께 실려서 조금 위안이 되었다. 유아기는 신체활동을 통해 가장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이 느끼고, 많이 이해한다는 내용이었다. 유아기는 만 8-9세까지라는 학계의 정의도 함께 언급되었다.
마음에 걸리는 또 하나는 ‘적응하지 못하고 돌아온 친구들이 다수’라는 표현이 있었다. 적응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고민해 보았다. 심리학 사전적 의미의 적응은 환경에 나를 맞추는가, 환경을 내가 바꾸거나 선택하는가의 문제로 나누어서 본다. 우리 학생들과 부모님들은 선택의 주체로써 환경을 선택한 것이라고 이해한다면 기자의 표현이 크게 틀린 것이 아니다.
굳이 적응하고 싶지 않은 환경에 적응을 하지 않고, 나에게 맞는 환경을 선택한 것이다. 우리 졸업생들이 공립학교생활에서 인지적으로 뒤진다는 말을 들은 적은 없다. 모두 그 환경에 맞추어져 가며 인지적으로는 오히려 앞서간다. 단지 안타까운 것은 창의적인 사고, 자발적인 활동 등 바람직한 부분을 포기하는 적응을 하게 되는 점이다.
교육학박사 임은정의 2020. 01. 09. 교육이야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