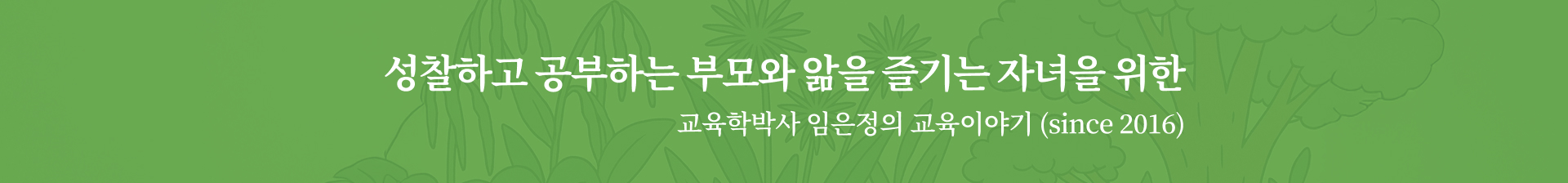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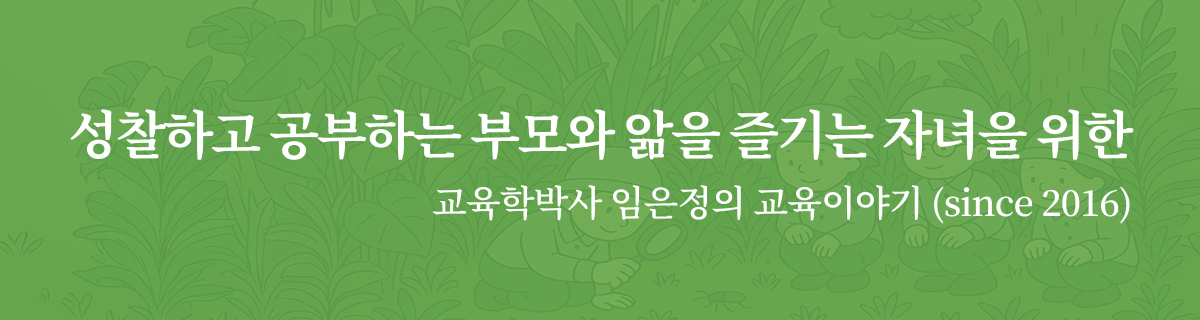
나이를 먹는다고 학교를 졸업한다고
절로 어른이 되지는 않습니다.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흔들리면서
조금씩 삶을 배워나가면서
그만큼씩만 어른이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어른이 되어갑니다.
김난도(2012). 천 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중에서
이 글을 보면서 우리 유아들이 자라가는 모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다. 빨리 무엇인가를 해주려고 종용하면 부작용만 생긴다. 정말 조금씩 미련해 보일만큼 천천히 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주었을 때 결과적으로는 바른 길에 서있다. 이번 주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한 세계 교육과정의 비교를 보면서 가슴이 답답해졌다. 이번에는 우선 독일, 일본, 핀란드만 정리해 보려 한다. 참고문헌은 지면 관계상 생략하기로 한다. 내가 독일, 일본에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나라처럼 전체주의적 학교로 시작된 나라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1등만이 목표였기 때문에 학생의 인권이라는 개념이 없었다. 어제 뉴스에 교사가 4학년 학생에게 스테플러를 던져서 안경이 깨져 눈 주위를 많이 다친 모습을 보면서 국제 비교가 더 절실해졌다.
최근 독일 교육동향은 선발적 분리교육에 대한 비판과 국제학력비교조사인 PISA 연구의 충격 등으로 인문계와 실업계 학교로 구분하는 개혁전략이 보류된 상황이다. 오히려 교육당국은 교실 내 학생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인문 실업계 통합학교인 게잠트슐레(Gesamtschule)와 게마인샤프트슐레(Gemeinschaftsschule)를 새로운 중등학교로 신설‧전환하는 등 다양한 학교개혁 방안을 실천하고 있다. 독일은 전쟁이후 판매원, 수공업자 등 단순 노무직종의 종사자 양성을 겨냥하는 실업계 중등학교인 하웁트슐레, 그리고 전기‧전자산업 분야 등 상대적으로 복잡한 기술을 요구하는 공업기술계 직종 종사자를 양성하기 위한 실업계 중등학교인 레알슐레,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인문계 중등학교인 김나지움이 대표적이었으며 경쟁을 부추기지 않았는데 여전히 경쟁을 지양하지만 이제는 이런 분리교육의 시대가 아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일본은 우리나라 학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대표적인 경쟁체제에서 벗어나 커리어교육을 개발하고 있다. 좁은 의미의 직업교육이나 진로교육을 넘어서 유치원부터 고등교육기관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개인이 사회적으로나 직업적으로 자립하기 위해 필요한 기반능력과 태도를 길러주는 것이며, 교육활동 전반을 통해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점이다. 단순히 직업체험이나 자원봉사활동과 같은 이벤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초·중·고의 학교단계를 거치는 동안 생각하고 습득하게 될 학생 자신의 커리어발달에 관련된 능력과 태도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의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 벌써 5년째 홋카이도(北海道) 교육위원회는 2015년부터 초·중·고등학교를 연구지정학교로 지정하였다. 이 학교들은 지자체나 지역의 산업계 등의 지원을 받으면서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커리어 교육을 하는 ‘초·중·고 일관 후루사토 커리어교육 추진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이때 ‘커리어노트’를 공통적으로 작성하였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홋카이도는 전문가와 도교육위원회 관계자로 구성된 ‘홋카이도 커리어교육 추진회의’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전문적 조언을 위해 전문가, PTA(Parent Teacher Association), 지자체, 경제단체, 가정교육 서포트 기업 등으로 조직된 ‘지역미래만들기회의’를 두었으며, 연구지정학교에는 효과적인 교내추진체제를 구축하도록 했다.
핀란드는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1∼2학년, 3∼6학년) 동안의 교육과정상 목표는 학생이 학습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며, 고학년에 진입함으로써 다양한 직업군, 산업체 등에 대한 정보를 접하게 된다. 또한, 지역 사회와 연계하여 다양한 일터를 방문하는 등 현실 직업세계에 대해 체험해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전체적인 3단계의 구성은 학생의 학습 능력과 진로 성숙도를 고려하여 학습 목표와 활동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단계적이고 유기적인 체계를 가진다.
세 나라의 공통점은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나가도록 돕는 곳이 학교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일찍 선별하지 않으며 타인과의 경쟁은 무의미 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유아기(만 8년)까지는 학습 방법을 개발하는 것에 집중하며 학습에 집중하지 않는다. 하나의 제도를 실행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고민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가고 있는가?
교육학박사 임은정의 2019. 05. 23. 교육이야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