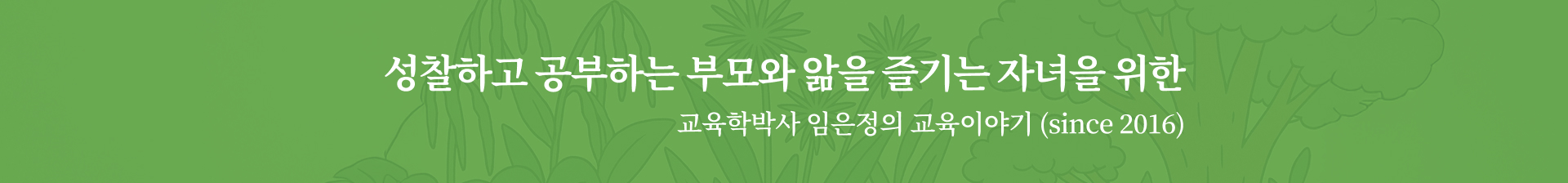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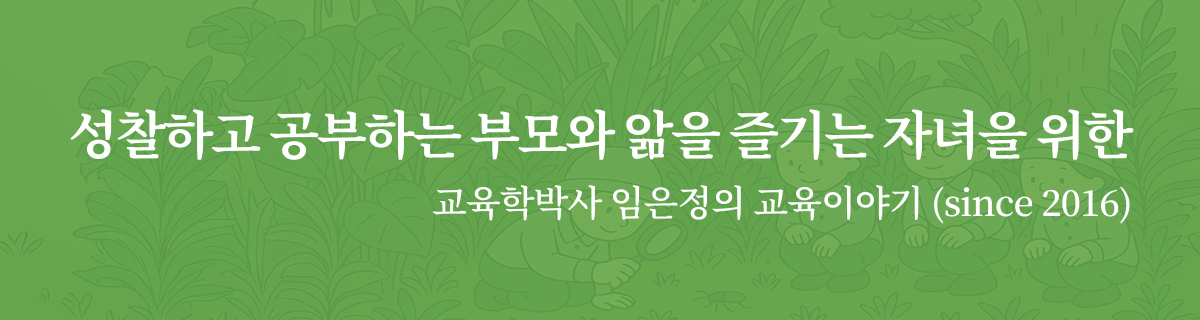
리터러시는 원래 단순히 문해능력, 수개념의 습득을 의미했지만 더 나아가 변화하는 사회에서의 적응하고 대처하는 능력으로 그 개념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제임스 포터(W. James Potter)는 모든 형태의 정보 공유 기술을 대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는 인지적(cognitive), 감정적(emotional), 미적(aesthetic), 도덕적(moral) 차원의 다차원적 개념으로 접근되어야 하며 그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을 꼽는다. 그렇다며 IT강국이라고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스마트기기 리터러시는 어느 정도 일까?
우리 주변에서 유모차에 앉은 채 스마트폰에 몰입하는 아기들을 보면서 그들은 과연 자연스럽게 스마트기기 리터러시에 접근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다. 그런 의문으로 스마트기기 이용수준에 대한 연구도 했고 지난해에는 한양대 소아정신과와 협동연구를 진행하기도 했었다.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한 청소년들에게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 익숙하지만 스마트폰으로 인한 수면 장애, 생산성 저하, 대인관계 방해 등의 부작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의 비율은 전체 조사대상(만 3세-69세)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PISA의 2015년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놀랍게도 우리나라 학생들의 디지털 기기 활용 역량에 대한 인식과 흥미는 30위로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ICT를 학습용으로 활용한 경험 비율은 단 한 번도 상위권을 차지하지 못한 채 최하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 비춰보면, 2000년 초반 자신만만해 보이던 디지털 교육 정책이 성공하였다고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유모차에서부터 익숙한 우리나라 학생들이 역량에 대한 이런 결과는 앞서 언급한 리터러시의 인지적(cognitive), 감정적(emotional), 미적(aesthetic), 도덕적(moral) 차원의 다차원적 접근은 뒤로 한 채 그저 재미에 급급하다가 중독이 되어 버리는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의 부재에 있다고 판단된다. 내가 우리 유아들이 디지털 리터러시가 가능해 질 때까지 스마트 기기의 사용이 제한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역량이 충분히 발달한 후에 기기를 사용해도 얼마든지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교육학박사 임은정의 2019. 09. 09. 교육이야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