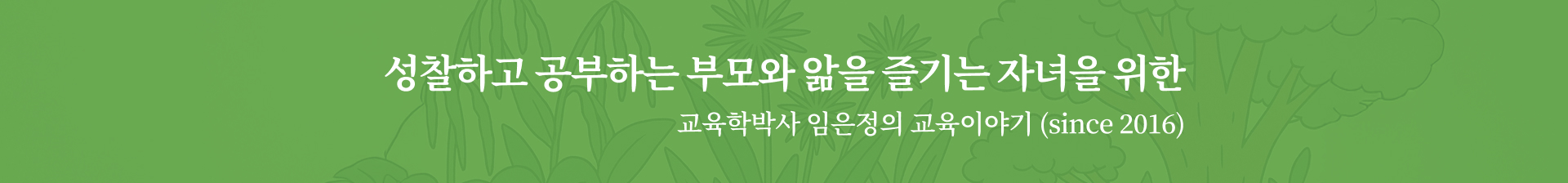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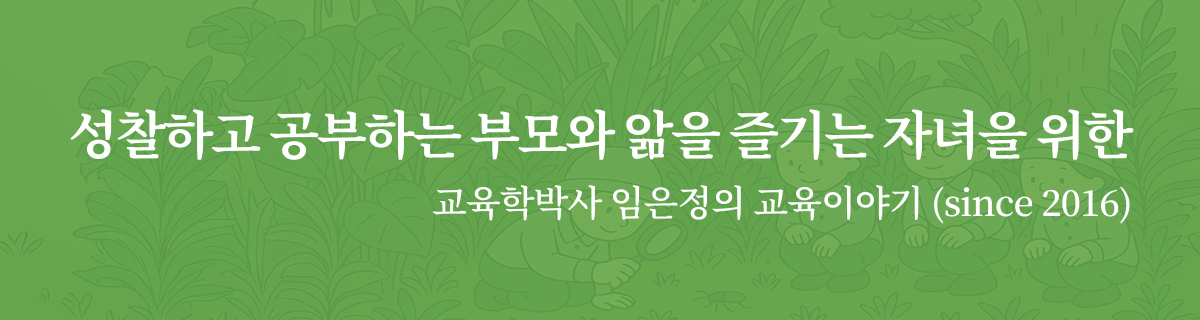
버섯이 자라는 환경을 암기하라고 했다면 암기와 동시에 유아들의 생활과는 동떨어진 하기 싫은 공부가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유아들은 스스로 문제를 만들고 대화 속에서 해답을 찾아 나가고 있었다. 문제해결중심의 학습, 생활과 밀착된 학습, 놀이로써의 학습이 모두 이루어지고 있는 대화였다.
유아1 : 선생님! 왜 숲에는 버섯이 많을까요?
교사 : 00이의 생각엔 왜 숲에 버섯이 많을 것 같아요?
유아1 : 음.. 버섯이 자라는 환경이 있어서?
유아2 : 버섯이 잘 자라려면…
유아1 : 습해야해!
유아2 : 맞아. 그리고 어두워야해.
유아3 : 나뭇잎이 많아서 어두운 게 유지가 되나봐.
유아1 : 그럼 버섯이 딱 살기 좋겠다!
유아2 : 어둡고 습한 건 똑같은데 자라는 버섯은 다 다르게 생겼어.
유아3 : 맞아. 검은색 버섯도 있고 갈색미치광이버섯도 있고!
유아1 : 더 찾아보자! 또 다른 게 있을 것 같애
교사의 개입이 최소와 되어도 유아들은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법을 찾아간다. 이렇게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유아들을 믿고 경험과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교사와 어른의 몫인데 억지로 만들어진 학습에 익숙해져버린 우리 사회는 그렇게 기다려 주지 못한다. 유아들의 말처럼 버섯이 살기 딱 좋은 환경이 있듯이 유아들의 가능성을 키우기에 딱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사회의 책임이다.
출산을 하면 얼마간의 금전이나 양육비 조금을 보조한다고 해서 출산율이 올라갈 리가 만무하다. 어른들이 행복하고 살만한 세상이라고 생각해야 출산율도 올라갈 것이다. 내 자녀가 끝없이 경쟁하고 재미없는 학습에서 헤매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자녀 양육에 기대가 없는 것 아닐까?
교육학박사 임은정의 2019. 09. 09. 교육이야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