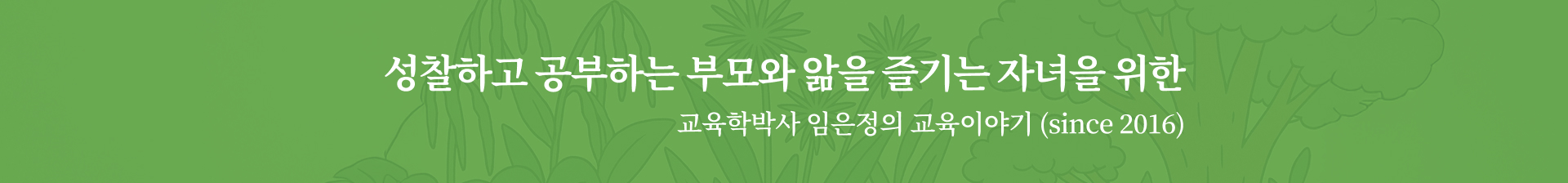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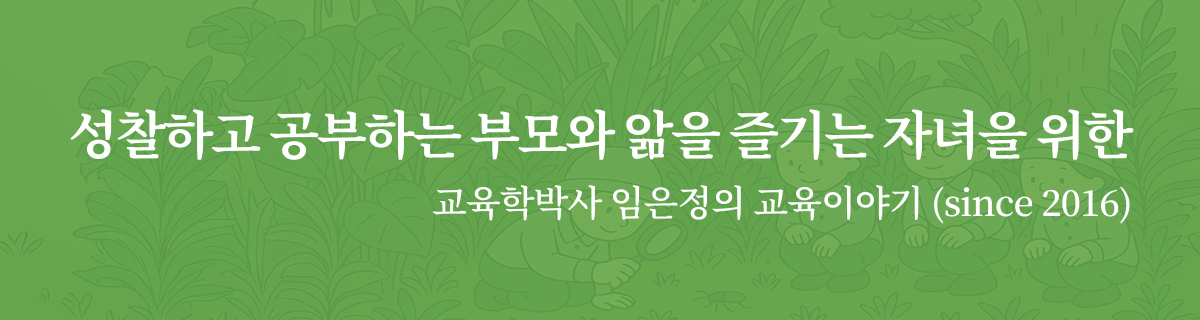
교사들은 교육에 대한 질문을 나에게 하고, 나는 새로운 이론이나 점검할 이론들을 설명하는 시간을 거의 매일 갖는다. 이런 연수 시간에 교육계획이나 교육 평가 등을 함께 이야기한다. 이 시간은 쉽지 않은 일과지만 교사들이 자부심을 갖고 임하는 시간이며 우리 유치원 교육의 근간이다. 나는 이 시간에 교사들에게 각 학급 유아들의 발달수준에 대해서 종종 질문을 하거나 질문을 받는다. 발달상황이 적절한지, 지금의 활동들이 발달에 적합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는 취지이다. 이런 질문을 하면 종종 나오는 교사들의 대답이 있다.
“호호가 갑자기 의욕이 없어요. 활동에 관심이 확 줄었고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조기교육을 하는 것 같아요.”
“하하는 재미가 없다고 하기도 하고, 숫자에 관심을 일부러 안 주는 것처럼 느껴져요. 아마 사교육을 하나 봐요.”
“방글이는 요즘 들어 갑자기 한글에 관심이 없어졌어요. 전에는 친구들 이름도 읽으려고 하고 관심을 갖기 시작했었는데, 학습지를 한대요. 그 이후부터 갑자기 글자를 안 보려고 해요. 그리고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어요.”
교사들의 이런 반응을 보면서 교육에 대한 용어를 정리할 할 필요를 느꼈다. 위의 대화처럼 조기교육. 사교육, 학습지 등등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는데 교사들이 느끼는 문제의식은 하나이다. 유아들이 억지로 하는 교육 혹은 관심이 없는 교육을 받음으로써 동기가 저하되는 것을 교사들이 걱정하는 것이다. 이럴 때는 어떤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지 생각해 봄으로써 유아교육에 대한 정의와 철학을 정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사교육은 교육의 병폐처럼 알려져 있는 용어이다. 그런데 사교육이 교육의 병폐라고 할 수 있을까? 국가가 불특정 다수의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공교육이라고 명명하는 것에 대한 상대적 용어가 사교육이므로 사교육을 모두 나쁜 것 이라고 할 수 없다. 부모의 철학이 확고하고 그 기관의 교육이 옳은 방식이라면 사교육이 병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사교육과 공교육은 교육주체를 일컫는 말이지 옳고 그름을 나타내는 말은 아니다. 단지 사교육과 공교육의 철학이 다르거나 두 가지를 모두 하느라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이 혹사하게 된다면 이는 병폐가 된다. 따라서 사교육, 공교육은 교육철학에 따라서 부모와 학생이 선택할 문제이다.
조기교육과 적기교육도 마찬가지이다. 인간은 태아기부터 학습을 한다. 교육의 사전적 정의는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 줌.’이다. 교육은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므로 조기교육이 적절한 시기에 발달에 맞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면 이 또한 필요한 교육이다. 교육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은 철저하게 교육 방법론에 달려있다. 우리 유치원은 36개월부터 입학을 하는데 “그렇게 어린데 무엇을 가르쳐”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연령이다. 하지만 발달해야할 과업들이 있으니 우리도 조기교육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적절한 발달과업을 적절한 방법으로 교육하니 적기교육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놀이를 통해서 학습을 한다고 하면서 교재, 교구, 시간표, 강사들이 있으면 놀이가 아니며 조기교육이지만 적기교육이 아니다.
봄반이나 여름반 유아들이 한글을 다 알 필요도 없고, 수도 높은 단위의 숫자까지 알 필요도 없다. 그러나 발달 단계상 관심을 기울이고 알고 싶어 하고, 조금씩 조금씩 발전하고 흥미를 보여야 하는 시기이다. 이런 시기에 오히려 흥미를 잃게 만든다면 선행학습을 시도 했으나 적기교육에 실패해서 조기교육도 실패한 것이다. 교육의 기초를 탄탄하게 하는 시기가 유아기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이 시기의 조기교육은 스스로 배우는 것이 재밌다는 것을 느끼도록 해주는 것이 목표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과 상황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유아기에 공부가 싫고, 재미없고, 지겹다고 느끼게 되면 돌이키기 어렵다. 앞으로도 학습과 공부에 대한 이미지가 그대로 남을 확률이 높아진다.
유아기에 철저히 배제되어야 하는 교육은 발달에 적합하지 않은 선행학습, 빠른 성과를 내기 위한 주입식 교육, 방식은 놀이 같지만 진도와 목표가 있는 유사놀이 교육이다. 하나의 교육철학과 방법에 집중하여 철저히 충실한 것이 교육적 가치를 얻을 수 있다. 최근 들어 공교육이 무너졌다는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은 교육주체의 정체성이 충돌을 하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철저히 교사, 학생, 학부모가 서로 신뢰하는 교육을 선택하고 집중하길 바란다.
교육학박사 임은정의 2020. 02. 06. 교육이야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