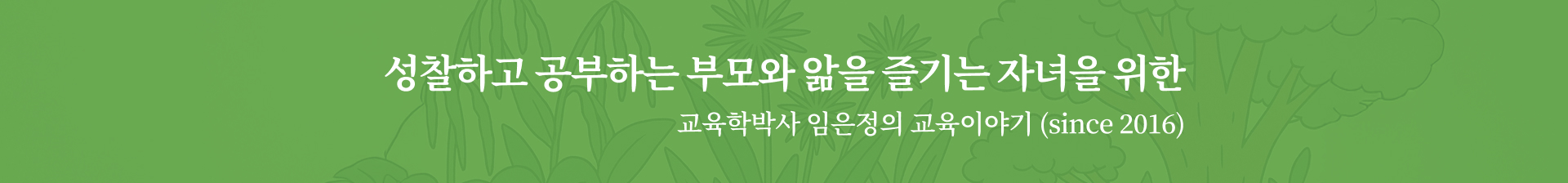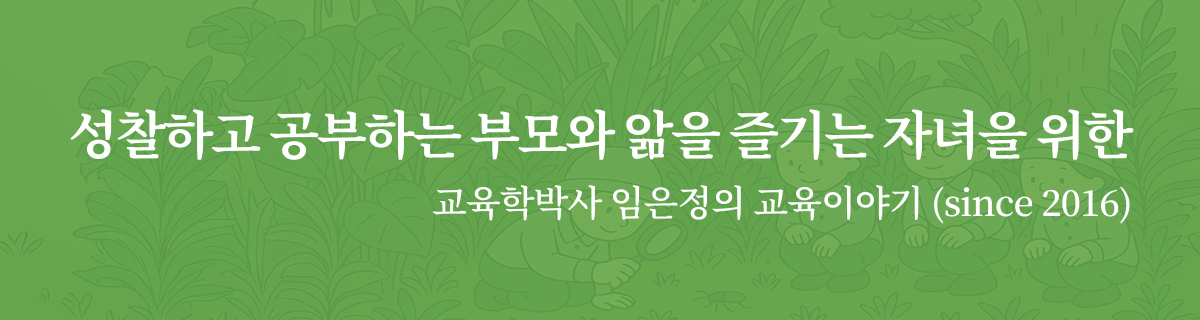지난 글에서 유아들의 수업결손 중 ‘수 개념’을 이야기했었다. 자연에서 수 활동을 많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 개념 발달이 어려웠다는 이야기였다. 이번 주 수업평가에 이런 수 놀이에 대한 교사들의 평가가 있어서 그대로 옮겨보았다. 다른 놀이와 함께 아래와 같은 수 놀이를 한다.
①시계의 60분 만들기를 자연물로 해보았다. 돌멩이 1개가 1분이라 했을 때, 한 시간이 완성되려면 몇 개의 돌멩이가 필요한지 질문을 하니 60개라는 답을 이야기 해 주었다.
②각자 15개의 돌을 세어 가지고 와 4명이 60분을 만들었다. 한 시간을 만들기 위해 60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는 것 같다.
③돌멩이 한 개가 1분입니다. 60분이 완성되려면 돌멩이 몇 개가 필요할까요? 돌멩이 60개가 모이면 몇 시간이 될까요? 라는 등 비슷하지만 다른 질문을 계속하였다.
이제 봄을 느낀다.
놀이터에서 봄이 되어 새롭게 피는 꽃과 잎을 찾는 상황. 콩이가 숲 놀이터 1층에 있는 진달래를 가리키며 이야기한다.
콩이: 여기에 진달래가 피고 있어요. 이게 진달래에요!
교사: 오, 정말요? 이게 진달래인가요?
콩이: 그리고 진달래는 요리해 먹을 수도 있어요.
교사: 색이 진한데 철쭉이 아닐까요?
콩이: 아니에요. 철쭉은 잎사귀가 먼저 자라요. 근데 이거는 아직 없잖아요. 그래서 진달래에요.
콩이는 철쭉과 진달래를 명확하게 구별하는 방법을 기억하고 자신의 지식을 적용하여 설명하면서 메타인지가 발달했을 것이다.
숲 활동 시간, 현이가 숲 놀이터를 돌아보며 새로운 꽃을 찾고 있다.
현이: 어!! 봉오리다! 봉오리!
교사: 그러네요! 여기 봉오리가..
현이: 빵빵해졌어! 봉오리가 빵빵해졌어!
달이: 이제 이렇게 빵빵해지다가 꽃이 피는 거예요?
교사: 네. 어떤 꽃이 필까?
달이: 와! 예쁘겠다!
현이: 이 꽃은 이제 곧 피겠다!
봄의 변화에 대한 활동으로 유아들은 작은 변화를 찾아다닌다. 그러면서 어제는 발견할 수 없었던 자연의 변화에 대해서 알게 되고, 스스로 찾은 경험에 대한 자부심과 뿌듯함을 느낀다. 이런 활동을 유아기 때 경험하는 우리 유아들의 민감함과 관찰력은 유아기 이후에 알게 되는 어른들보다 훨씬 정교하며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
“아니야, 나 집에 갈 거야. 스마트폰하고 장난감이 없어서 집에 가야 해.”
이 이야기는 봄 반의 쫑이가 아침에 유치원에 오면서 한 이야기이다. 봄의 변화를 찾아다니는 유아들과 쫑이의 이야기가 대조를 이루면서 무엇이 유아들에게 필요한 것인지 보여주고 있다. 쫑이는 팬데믹을 겪으면서 최대의 피해자가 된 것인지도 모르겠다. 더불어 부모님들의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영유아기에 스마트기기는 절대 ‘독’이다. 너그럽게 양보해서 24개월까지는 손에 스마트기기를 쥐여 주면 안 된다는 학자들이 있다. 나를 포함한 비현실적이고 솔직한 학자들은 중학생이 되기 전에 보여주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스마트폰과 장난감은 모두 심각한 발달장애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위험한 물건들이다. 그런데 쫑이는 36개월이 겨우 지났는데 스마트폰과 장난감에만 관심이 있다.
“남들도 다 하는데 괜찮겠지.”, “안 주면 우리 애만 뒤쳐질지도 몰라.”
“어차피 우리 애들은 스마트기기 속에서 살아야 하니까 괜찮아.”
“이렇게 원하는데 어떻게 안 줘, 애들 의사를 존중해서 민주적으로 양육해야 해.”
부모, 교사, 교육기관, 사회, 그리고 교육당국은 모두 위와 같이 생각하며 합리화를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내면에는
“그래야 내가 편하지. 나도 좀 쉬어야 해.”
“수업 공백 운운하지 못하게 뭐라도 해야 해.”
“이런 기기로 해야 오래 앉혀놓고 공부를 시킬 수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때이다. 자연을 관찰하고 교사와 친구들과 함께 하는 교육보다 스마트기기와 장난감이 효과적인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유아들을 위해 상황을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학박사 임은정의 2021. 03. 23. 교육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