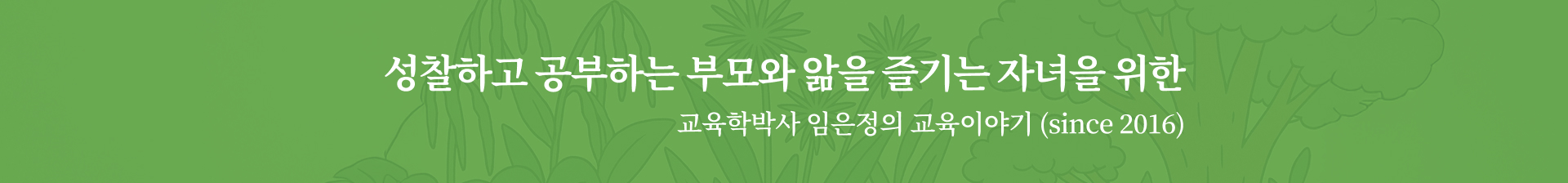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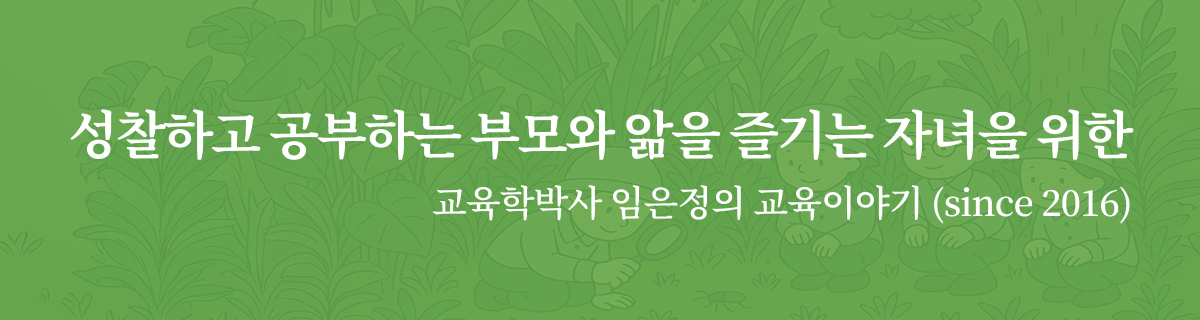
교육의 목표와 그 목표달성을 위해서 해야 하는 교육방법 및 교육의 평가는 논리적으로 맞아야 한다. 예를 들어 교육 목표는 건강한 사람인데 교육방법은 온종일 앉아있는 주입식이라면 교육평가는 필요도 없을 만큼 이미 실패한 교육이 된다. 교육 목표가 건강한 사람이라면 교육방법은 발달 단계마다 적절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중간중간 교육에 대한 평가를 부모와 자녀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한다. 세 살 때부터 교육한다면 최종의 장기적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목표와 방법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목표도 없고 원하는 바도 없이 그저 남들 하니까 교육을 시킨다면 종착지를 모르면서 이리저리 헤매어서 정 위치에 도착할 수 없다.
내가 생각하는 세 살부터 여섯 살까지의 교육 목표는 모든 발달에서 건강하기 위한 기초를 닦는 것이다. 궁극의 목표가 건강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성장기까지는 누구나 성장이 멈춘 사람보다 더 많이 아프다.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고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된 길로 가도 결과는 큰 차이가 난다. 유아기에 비슷해 보여도 시작이 5° 정도만 엇나가면 나중에 원주의 거리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 식습관에서도 그렇다. 건강하게 먹는 것이 유아기에 가장 중요하다, 건강한 음식을 적당량 먹는 습관이 제대로 잡혀 있을 때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유아기에 조금 하는 편식이 신체, 사회, 정서, 인지 건강에 점차 큰 차이를 만든다.
사회적 건강을 위해서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나도 타인으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는 연습을 해야 한다. 성인들조차도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타인에게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많다. 그것은 유아기부터 연습이 안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정서적 건강은 슬픈 일이 있을 때 적절한 방법으로 풀어가는 연습을 해야 한다. 인지적 건강은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알게 된 것을 기쁘게 느끼고 활용하고 싶어지는 지적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기초를 만드는 것이 유아기의 목표여야 한다.
궁극적인 교육의 목표를 한번 생각해 보자.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목표이면 안 된다. 그 이후의 삶이 즐거워야 하는데 그 다음 목표는 없이 대학만 가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처럼 우리는 흔하게 들으면서 자랐다. 하지만 좋은 대학을 간다고, 또는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한다고 그걸로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살아보면 경험상 안다. 그래서 교육의 목표를 그렇게 단편적으로 두어서는 안 된다. 교육의 목표는 언제까지나 진행형이고 자기가 행복한 인생을 사는 방법을 찾는 것이어야 한다. 의사를 목표로 공부했다면 의사가 되면 끝나고 더 이상의 발전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의사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의사로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발전하고 싶은지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교사를 목표로 공부했다면 교사로서의 목표가 있어야 하고, 자아효능감과 맞지 않는다면 자아효능감을 찾도록 수정해야 한다. 한숲의 한 학생은 생물학을 전공해서 생물학 교수가 되는 게 꿈이 아니라 생물학 교수가 되어서 아마존의 많은 생물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게 꿈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나는 참으로 부럽다고 이야기해주었다. 꿈은 이런 것이어야 한다. 계속 진행하고 발전하는 목표가 있어야 한다.
교육의 목표가 수능을 잘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지금부터 수능 문제를 잘 찍는 족집게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과정이다. 그것이 아니고 건강한 자신의 삶을 위한 목표를 갖기를 바란다면 유아기에 건강의 기초체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제발 어떤 나라도 하지 않는 유아기 종합반은 보내지 말자. 유아기 단과학원을 보내기 위해서 중요한 루틴을 망치지 말자. 유아기에는 자유로운 환경에서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하는 과정을 알아가야 한다.
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생각이 양극단으로 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무조건 부모의 생각대로 주입식 공부를 시키고자 하는 축이 하나이다. 반대로 놀다 보면 알아서 할 것이라는 식의 극과 극 개념으로 가고 있는 것이 느껴진다. 이는 놀이가 강조되면서 일부 부모들에게 생긴 오개념이다. 연령과 상관없이 무작정 뛰어놀기만 하면 좋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이다. 놀이는 유아들의 삶이자 앎의 전부이지만, 발달에 따라서 다르게 지원되어야 하며 놀이의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놀이는 신체적 자발성이지만 이를 밑거름으로 사회적 자발성이 발휘되어야 하고 가을 학년쯤 되면 인지적 자발성이 생기도록 지도해야 한다.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즐거움이다.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놀기만 하는 것이 최고로 좋은 유아기 교육이지만 그만큼 어른들의 세심한 뒷받침과 배려가 있을 때 유아들이 건강의 기초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교사들과 부모가 단어 하나하나도 세심하게 생각해서 대화하고 잘못된 행동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건강한 음식을 먹도록 해주어야 하고, 건강하게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하며, 매일매일 열심히 책을 읽어주어야 한다. 책 읽기는 선택이나 취미가 아니라 유아의 생활이자, 목표를 진행형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교육학박사 임은정의 2024. 04. 25 교육이야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