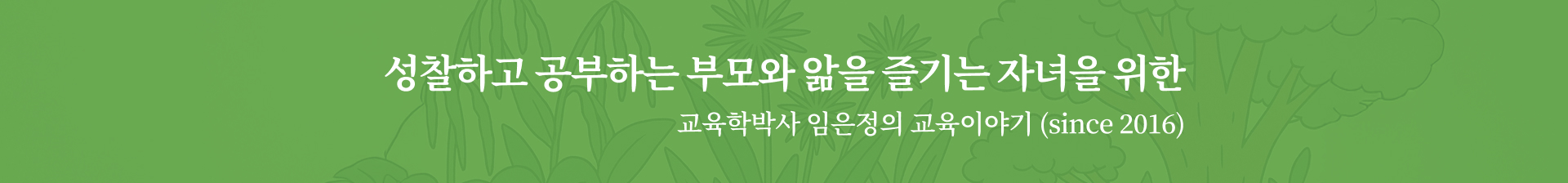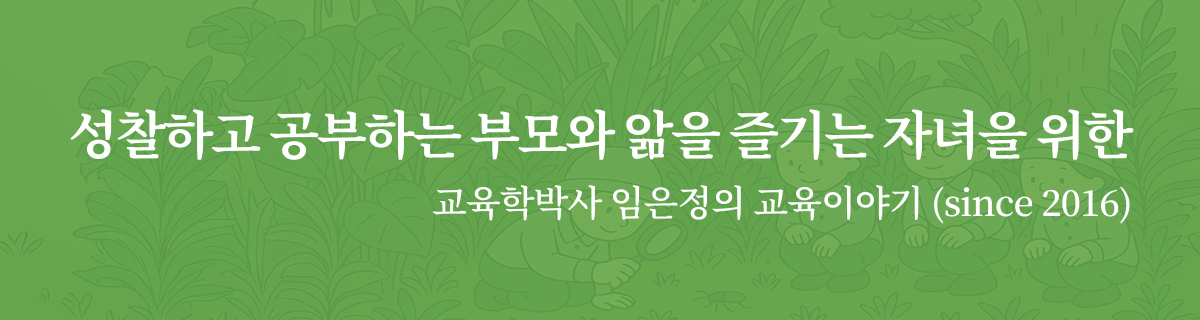한국은 디지털 교과서의 도입을 추진했는데 채택률이 생각보다 저조하다는 기사가 나왔다. 나는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디지털 교과서를 하면 바로바로 답을 알려주니까 좋아요”라고 하는 학생의 인터뷰를 보았다. 이 내용대로라면 큰일이다. 빠르게 답을 맞히는 것은 학생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민하고 사고할 기회를 빼앗는 나쁜 방법이기 때문이다. 디지털 교과서가 AI 시대에 걸맞는 교육 방법으로 전환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돈이나 정치 권력의 논리 때문인지 모르겠다. 우리나라는 발 빠르게 AI를 활용한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여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해서 나는 매우 한심하다고 생각했다. 돈의 논리이든 정치적 힘의 논리이든 그 무엇이든 상관없다. 나의 신념으로는 디지털 교과서 선정은 무조건 잘못된 일이다.
디지털 교과서는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 그 이유는 명확하다. 종이책에 기반한 학습이 사고력을 넓고 깊게 만드는 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나의 신념을 뒷받침해준다. 그러나 나는 단지 연구 결과나 이론만을 근거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30년 넘게 교육 현장에서 직접 어린이들을 만나고 가르쳐 온 경험이 이와 같은 판단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주었다. 현장에서 목격한 것은, 깊이 있는 사고를 요구하는 학습 기회가 줄어들수록 학생들의 사고력과 창의성이 함께 약화된다는 명백한 사실이었다.
디지털 교과서는 개별 학습을 할 수 있어서 바람직하다는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개별 학습이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이다. 진정한 개별화 학습은 각자의 속도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도전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다. 단순히 정해진 진도에 맞춰 “너는 늦었다”, “너는 빠르다”를 비교하는 것은 개별화가 아니라 학습 격차를 직시하라는 채근일 뿐이다. 진정한 개별화 교육이란 각자 하고 싶은 공부를 주도적으로 선택하고, 관심이 맞는 학우들과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하는 즐거움을 경험하는 것이다.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는 열린 기회를 제공하는 것, 그것이 개별화 교육의 본질이다.
종이책을 읽으며 천천히 사고의 흐름을 따라가는 과정은 단순히 정보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다. 정보를 곱씹고, 재구성하고, 스스로의 언어로 바꾸어 표현하는 사고의 과정이다. 디지털 매체는 편리함을 줄 수는 있으나, 학습자의 인지적 수동성을 높이고 깊이 있는 이해를 방해할 수 있다. 특히 어린이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학습이란 단순히 정답을 맞히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디지털 교과서는 교육의 본질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다.
나는 시대의 흐름을 무조건 거부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기술을 적대시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교육만큼은 ‘빠른 속도’보다 ‘느리지만 바른 방향’이 중요하다. 우리는 학습자들에게 더 깊이 있는 배움을 제공해야 하며, 그것은 디지털 기기보다 책 한 권에서 시작될 수 있다. 2024년 컬럼비아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10~12세 아동이 종이책을 읽을 때 디지털 화면을 볼 때보다 더 깊은 이해와 의미 처리를 보였으며, 뇌파 측정 결과 종이책이 더 깊은 인지적 처리를 유도한다고 분석되었다. MIT 연구에서는 동일한 내용을 학습할 때, 독서 그룹의 중앙값 점수(90%)가 영상 시청 그룹(80%)보다 높았다. 스페인과 이스라엘 연구진이 수행한 메타분석 결과에서도 종이책을 통한 학습이 더 높은 이해도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University of North Texas연구에 따르면, 영상이 배경으로 있는 환경에서 읽기 과제를 수행할 경우 읽기 이해도가 낮아졌다. 신경과학자 Nicola Morgan은 독서가 영상보다 더 많은 뇌 영역을 활성화 시켜 더 깊은 인지적 처리를 돕는다고 설명했다.
유아기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종이책 읽기이다. 스마트기기의 본격적인 대중화가 시작된 지 이제 약 10~15년 정도가 되었다. 영유아기에 스마트기기에 노출된 세대가 현재 문해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약화되는 수준이지만 앞으로 얼마나 심각한 부작용을 안게 될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이들을 사탕으로 달래거나 학습을 스마트기기로 시키는 발상은, 실리콘밸리 연구자들이 자신의 자녀에게 절대로 스마트기기를 주지 않는 것과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한국은 그럴수록 창의성, 노벨상, AI 선도국가와는 점점 더 멀어질 것이다.
교육학박사 임은정의 2025. 04. 29. 교육이야기
참고문헌
Kolirin, L (2024, January 17). Children understand stories vetter on paper than screens, brain scans suggest. The Guardian.
MIT Integrated Learning Intiative. (n.d.) Compared to reading, how much does video improve learning outcomes?.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Oro D., & Brazilai, S. (2023). Reading comprehension: Paper vs. screen. Science News Explores.
Jeong, S. H., & Hwang, Y. (2014). Reading while watching video: The effect of video contect on reading comprehension and media multitasking ability. ResearchGate.
Morgan, N. (2021, September 22.) Films or books – what’s the brain difference.
Allen, M. (2023, December 15). Kids comprehend better on paper, studies find. Axios.
김은영, 구자연, 김지원, 김혜진, 김재철, 김종근, 조숙인, &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2024).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과 발달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 2024-13). 육아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