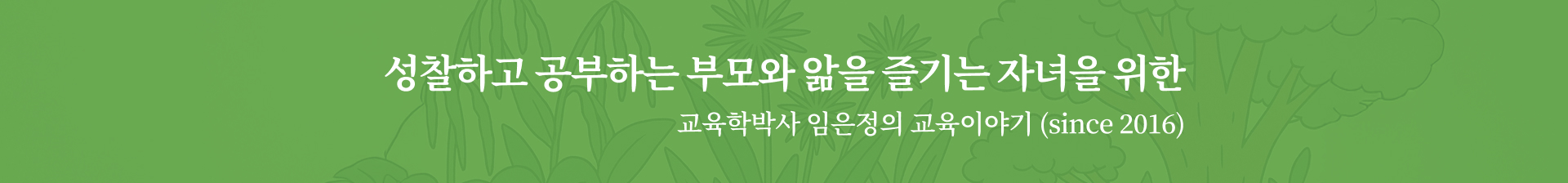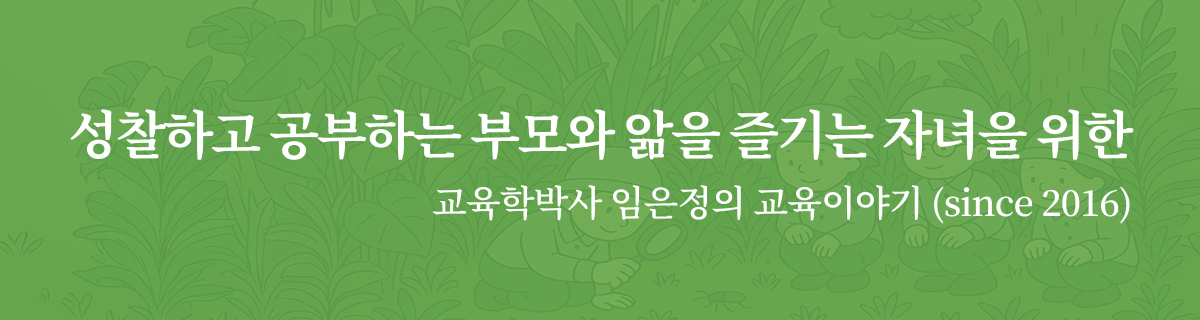나는 유아들이 하루종일 좁은 영어학원에 갇혀 지내는 것은 그로 인해 잃는 것이 너무 많다고 오랫동안 이야기해왔다.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없고, 오히려 더 확고해졌다. 그런데 문득, 내 안에서 이런 질문이 다시 떠올랐다. ‘유아들이 영어를 배우면 안 되는 걸까?’라는 물음이었다.
유아들이 영어를 배우는 것이 절대적으로 금지되어야 할 일은 아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두 언어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자라는 유아들은 자연스럽게 두 언어를 동시에 접하게 된다. 이중 언어 습득과 관련된 여러 연구를 보면, 결손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특정 발달이 다소 느려질 수 있다는 보고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고려할 때, 유아기에 영어 학습을 도입할 때는 매우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영어를 배우는 과정이 유아의 전반적인 발달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언어 발달은 물론이고 정서적, 사회적, 신체적 발달 역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발달의 결손은 5살이 되어도 혼자 밥을 먹을 수 없고, 손에 힘이 없어 연필 사용도 어렵고, 독서량이 적어 문해력이 떨어지는 등 많은 문제를 낳게 된다. 둘째, 영어가 ‘학습’이 아니라 ‘생활’의 일부로 느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억지로 외우고 따라 말하게 하는 방식은 오히려 언어에 대한 흥미를 잃게 만들고, 영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학습의욕을 떨어뜨려 학습의욕을 잃은 학습자를 만든다. 셋째, 지금 유아가 흥미를 가지고 있는 주제나 놀이를 영어와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방식이 필요하다. 그래야 유아의 관심과 발달 흐름을 존중하면서 언어도 함께 성장시킬 수 있다.
유아기에 영어는 ‘무조건 시켜야 하는 것’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도 아니지만, 유아의 삶과 발달을 중심에 두고 교수-학습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에 내 생각이 맞춰졌다. 나의 학생들이 고등 검정고시를 마치고, 두 달 전부터 매일 30분씩 숲에서 영어를 추가로 했다.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실력이 붙었고, 어느 날 학생들의 발전된 실력에 놀랐다. 그날 했던 수업 내용을 선생님이 영어로 바꾸어 설명 혹은 질문을 하거나, 게임을 하는 방식으로 영어 활동이 진행되었고, 이러한 과정이 쌓이며 놀라운 향상의 계기가 되었다.
예를 들어, 뇌에 대해 발표한 날 영국 교과서의 같은 내용을 보여주고 설명했더니, 제법 어려운 단어와 문장을 기억해 냈다. 학생들은 그날 배운 내용을 바로 활동으로 이어가며 몰입했다. 과학 용어가 낯설고 어려웠지만, 함께 하니까 금방 이해하고 흥미를 느꼈다. 과학 교사가 아님에도 교사 역시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알아가는 데서 재미를 느꼈다고 했다. 인상 깊었던 것은, 학생들이 교사가 준비한 영국 교과서 자료를 진지하게 들여다보며 “이게 뭐고, 저게 뭐다” 하고 스스로 설명하는 모습이었다. 외우지 않더라도 영어로 설명하는 연습 과정 자체가 학습이 되었다. 서서히 수준이 높아졌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은 그 효과가 눈에 띌 정도로 향상되었다.
‘스스로 공부하며 앎을 즐기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들은 유아기부터 스스로 할 일을 찾는 습관을 천천히 길러왔다. 교육은 하루아침에 결과를 내는 일이 아니다. 이 사실을 모든 교육자가 다시 각성해야 한다. 이번 활동에서도 신체 기관 만들기에 참여하지 못하고 주변만 맴도는 학생이 두 명 있었다. 이유는 간단하다. 반복된 결석과 지각으로 몰입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다른 친구들과 나눌 수 있는 대화가 없는 것이다.
예전에 3년간 함께 근무했던 영어 선생님이, 숲에서 영어를 할 때와 교실에서 할 때의 차이가 크다고 했던 기억도 떠올랐다. 한 달 전부터는 유아들도 숲에서 놀 때 영어로 놀아보면 어떨까 고민하게 되었다. 학생들의 사례를 보면, 숲에서는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 분명히 느껴졌다. 다만, 학생들과 유아들의 차이는 문해력, 어휘력, 지식 수준이다. 학생들은 과학, 역사, 철학, 사회 등의 수업을 하기에 동기와 자료가 충분하고, 실력 향상이 눈에 띌 수 있다. 그러나 유아들은 지금 영어를 해봤자 ‘3살 영어’, ‘4살 영어’, ‘5살 영어’가 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그것이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나도 자신이 없다.
결국, 중요한 것은 ‘스스로 하고 싶은 걸 하는 것’이다. 유아가 스스로 찾고, 말하고, 정리하고, 다시 사용하는 그 모든 과정이 진짜 배움이다. 교사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 유아가 중심에 설 때 배움은 훨씬 깊어진다. ‘3살 영어’, ‘4살 영어’, ‘5살 영어’의 효과성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범 운영을 통해 관찰하고 성찰할 계획이다.
영어학원에서 하루 5시간씩 책상에 앉아 있던 유아들의 수준이 대단하지 않기에, 내가 의도한 교육도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교재를 어디까지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유아들이 얼마나 흥미를 느끼고, 얼마나 배움에 대한 즐거움을 느꼈는지가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똑같은 교재를 사용하고 하루종일 영어만 사용하는 학원들은 교육 결과에 대한 실질적 효과 없이 거짓을 과장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물론 어떤 요인에 의해 영어권 3세, 4세, 5세만큼 할 수 있는 유아도 있겠지만, 모든 유아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교사의 개별화된 교육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효과가 미미하더라도 유아들의 발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원칙을 지켜 숲에서 영어 시범 운영을 하고자 한다.
1. 사전에 영어 계획안이나 교재는 제공하지 않는다.
2. 영어에 관한 조급함이나 확인하려는 욕심을 내지 않는다.
3. 느긋한 마음으로 발현적 교육과정의 효과를 성찰한다.
교육학박사 임은정의 2025. 06. 12. 교육이야기
참고문헌
Kim, S., & Lee, J. (2024). Korean-English bilingualism in early childhood: A longitudinal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Bilingual Education and Bilingualism, 27(2), 200–218.
Nguyen, H. (2023). Culturally and linguistically diverse preschool experiences in Korea (Master’s thesis, San Diego State University).
Park, M., & Cho, Y. (2015). 다문화아동 이중언어 사용 추이 분석 (2010–2014). 교육사회연구, 25(3), 20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