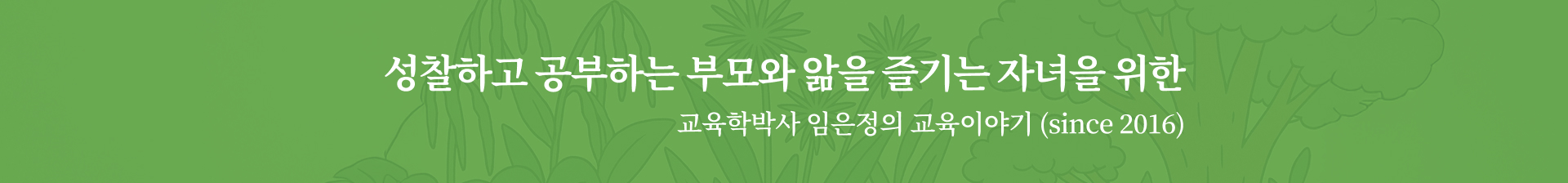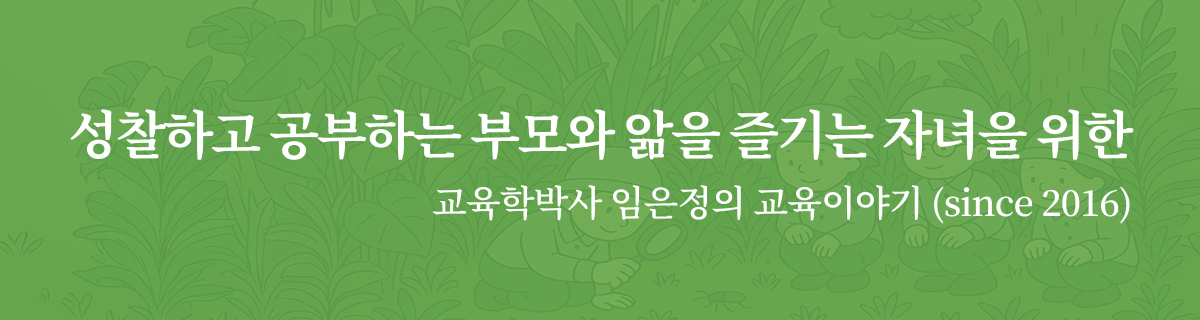나는 요즘 ChatGPT를 수업 준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정리하고, 학생들에게 보여줄 시각 자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단순한 도구로 사용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ChatGPT를 활용하는 과정 자체가 수업의 일부가 되고 있다. 이번 수업의 주제는 ‘세계의 기후’였다. 학생들이 각 기후대의 특징을 이해하고 발표하는 활동을 하였다. 나는 학생들에게 기후 특징과 그래프의 개념을 함께 익히도록 ChatGPT에게 각 기후를 대표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기후 그래프를 그려달라고 요청했다. ChatGPT는 도시별로 적절한 기후 유형을 골라내고, 그래프를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구성했다. 겉으로 보기엔 완성도 높은 결과였지만,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드러났다.
내가 그래프 축 범위나 비교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서 ChatGPT는 ‘보기 좋은’ 그래프를 만드는 데 집중했다. 열대 지역은 영하의 기온이 없다는 이유로 아예 그래프에서 영하 구간을 제외했고, 현대 지역은 영상 20도를 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도록 처리해 버린 것이다. 결국, 도시 간의 기후 비교라는 학습 목표는 흐려졌고, 나는 다시 그래프에서 y축의 범위를 영하 20도에서 영상 40도까지 일정하게 맞춰달라고 지시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또 하나의 수업 거리가 생각났다. “같은 하노이인데 선생님이 처음 시킨 그래프와 다음에 시킨 그래프는 왜 다를까?”, “여기는 0도가 있고 여기는 없어요.”, “두 번째 그래프들을 y축이 온도 간격과 구간이 일정하게 설정되었는데 첫 번째 그래프들은 기후에 맞추어서 설정했어요. 그러면 비교하 어려워요.” 학생들은 각각의 눈높이에서 나름대로 이야기했다. 나는 이런 사소한 일들이 AI 시대에 필요한 사고력이라고 생각한다. 코딩을 가르친다고 유아기부터 코딩학습지를 시키는 것은 오히려 시대착오적인 주입식 교육이다. 누군가 똑같은 속도와 똑같은 내용으로 구성해 놓은 모든 지식은 주입을 위한 교육이다. “여기는 0도가 있고 여기는 없어요”라고 이야기한 학생들은 원하는 두 그래프를 공책에 그려보도록 했다. 그리는 과정에서 또 다른 생각이 떠오를 것이다.
교사도 학생도 AI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ChatGTP가 알려주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요구를 구체화하고 수정 요청을 하고 내가 추구하는 수업의 방향에 맞게 다시 구성해 낼 수 있어야 한다. AI와 함께 수업을 설계하며, 학생들이 단순한 지식 소비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의미 생산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지금 내가 가야 할 교육의 방향이다. 미래에는 지식을 생산할 수 있는 지혜로운 인재가 양성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은 이미 오래전이지만 현재 교육은 30년 전, 그보다 더 오래전의 교육에도 못 미칠 정도로 답습되고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노동이다. AI 교과서를 사용하는 것이 새시대를 대비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이 이야기하는 추후에 좀 더 길게 말하려 한다)
최근의 자료가 궁금해서 찾아보고 정리해 보았다. AI 시대에 요구되는 인재상은 주어진 문제를 푸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찾아내는 힘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데이터 속에서 불일치를 인식하고, 그 안에서 본질적인 질문을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이어서 또 다른 인재상은 비판적 사고와 정보의 진위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능력들은 기존의 기술, 인문, 예술의 경계를 넘나드는 통합적 사고가 요구된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 기존 지식을 재구성하고, 새로운 조합을 시도하는 창의성이 핵심이다. 이 모든 역량의 바탕에는 윤리적 민감성과 사회적 책임감이 받쳐주고 있어야 한다.
이런 인재가 양성되기 위한 교육환경은 지식 전달이 아니라 사고 훈련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정해진 내용을 암기하는 수업이 아니라, 질문하고 분석하며 사유하는 과정 중심 수업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내재된 지식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 지식을 내재화하는 방법이 시험을 위해 단시간에 암기하는 형식이 아니라 사고하기 위해서 꺼내어 생각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내재화되어야 한다. 모두 같은 내용을 진행하는 일제식 수업에서 맞춤형 수업으로 전화되어야 한다. 지식을 과목별 단원별로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삶과 연결된 맥락에서 교과를 통합하는 융합적 교육이 요구된다. 정답을 요구하는 교육이 아니라 새로운 생각을 발전시키는 교육이어야 한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다움을 가르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교사는 감정, 가치 전달을 담당하는 사람다움을 가르치는 존래로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매우 피상적인 표현들 같지만 나는 이제 그 방법을 찾았기에 피상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앞으로도 내가 찾은 수업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가려 한다.
교육학박사 임은정의 2025. 04. 25. 교육이야기
Digital Education Council (2024). AI literacy framework
Educase (2024) Must-have competencies and skills in our new AI world.
UNESCO (2024) AI competency framework for teachers
https://unesco.org/ark:/48223/pf0000386887
UNESCO (2024) AI competency framework for students
https://unesco.org/ark:/48223/pf0000386888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19) OECD Learning Compass (2030: Concept note. OECD Publishing)
Unesco 한국위원회 (2025, January 24) AI 시대에도 교육 격차 완화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Retrieved from https://unesco.or.kr/250124_02/